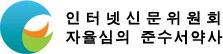013. 해 뜨고 지는, 마량포구(馬梁浦口)에서
포구의 안온과 휴식과 더불어 간간히 밀려오는 이웃의 웃음소리와 갈매기의 끼룩거리는 소리가 만찬을 준비하려는 듯 바쁜 아낙의 손길처럼 따뜻하게 들려온다.
아, 이 아름다운 포구의 정경(情景)이야말로 세상의 모든 그리움이란 그리움을 모조리 끌어 안겨주는 듯 삶의 향기를 북돋워주면서 가슴 설레게 한다.
마량 포구의 푸른 물결은 끝없는 이랑을 만들어대고, 힘찬 바다 물이랑은 하늘 높이에서 푸르름을 끌어내려 한 몸을 이루더니 마침내 갈매기의 흰 날개 빛으로 바다와 하늘 사이를 활기차게 한다.

2019년 10월 10일 목요일.
바다를 향해 달린다. 길은 군도 5호선, 2011년 국토해양부 선정 한국의 경관도로 52선 중 ‘낙조 감상하기 좋은 해안길’로 선정된 그 도로 위를 가볍게 달린다.
이미 낙엽으로 변해버린 잎을 다 떨어뜨리고 매끄럽고 깔끔하게 돋보이는 나무결과 바다를 곁눈질로 바라보면서 천천히 달린다. 모름지기 해안도로를 달릴 때는 갑자기 속도가 줄어든다. 넘실대는 푸른 파도가 이랑이랑 넘실대고 있으며, 저 멀리 작은 섬의 아리아리한 모습은 무한으로 눈길을 잡아놓기 때문이다.
어디 그뿐이랴, 파도와 함께 춤을 추는 갈매기들의 군무(群舞)는 가뜩이나 끌어안고 있는 햇살무리들과 한데 어울려 눈부시게 한다. 푸른 바닷물결과 갈매기와 햇살이 이루는 하모니(harmony), 문득 어디선가 아름다운 선율이 들려오는 듯하다.

물론 지금 찾아가는 곳은 우리나라 최초 성경책이 전해진 곳으로 유명한 마량포구이기는 하지만 그와 더불어 해 뜨고 해지는 곳으로서도 유명할 대로 유명해진 마량포구의 품에 안겨보기 위해서이다. 한곳에서 해 뜨고(Sunrise), 해지는(Sunset) 경이로움을 가진 곳이 곧 마량포구이다.
어디선가 1971년에 개봉된 노먼 주이슨(Norman Jewison) 감독 영화《지붕 위의 바이올린(Fiddler On The Roof)》이라는 영화의 주제곡 <Sunrise, Sunset>, 그 아름다운 바이올린의 선율도 슬그머니 밀려왔다가 사라진다. 파도의 하얀 포말처럼 슬그머니 부서지면서 사라진다.
해안가 푸른 솔숲을 끼고 한참을 달라다가 확 트인 바다를 만난다. 파도는 역시 가까이 보아야 제 맛을 느낄 수 있는가 보다. 바닷바람에 흰 거품을 내던지고 거침없는 숨소리를 토해냈다가 슬그머니 거품을 거둔다. 파도는 서로가 서로에게 안긴 듯 품긴 듯 포근히 감기더니 이내 하나를 이룬다.

이런 파도의 뒷모습을 보면서 미국계 영국 시인, 극작가이며 문학비평가인 T.S. 엘리엇(Thomas Stearns Eliot. 1888.~1965)은 <J.A. 프루프록의 연가(戀歌)>에서 ‘희고 검은 파도를 바람이 불 때/ 뒤로 불리는 파도의 흰 머리를 벗기면서/ 그들이 파도를 타고 바다로 가는 것을 나는 보았노라’>라고 노래했는지도 모른다.
멀리 보이는 마량포구를 향하여 한창 달린다. 길은 몇 번 갈래길에 이르고, 바닷가를 따라 달라다 보니. 언덕 위로 갑자기 높아져 간다. 바로 그 언덕에 바다를 배경으로 한 <마량포 해돋이마을>이라는 입석이 세워져 있다. 그 옆으로는 2013년 <서천 지명탄생 600주년 기념> 조형물과 함께 장승 몇이 환하게 웃고 있다. 평화로운 여유로운 모습이다.

그런 장승의 어깨를 너머로 아, 바다가 가득하다. 호수처럼 조용하다. 출렁이는 물결이 잠꼬대 속 같은 작은 몸놀림을 계속한다. 길가에 심겨진 동백나무에서 철모르게 핀 붉은 동백꽃 몇 송이가 장승처럼 환하게 웃음을 터뜨린다.
도로 언덕 밑으로 스스로 미끄러지듯 내려가니 해안가로는 모두 매립지이다. 전에는 한껏 벌린 엄지와 검지 사이처럼 곡선으로 그려놓은 듯한 포구가 아니었던가. 해안으로는 좁은 도로 한 켠으로 즐비하였던 횟집들의 모습을 그립게 한다.
그러나 이제는 좁은 도로가 아니라 2차선의 포도(鋪道), 그리고 매립지는 바둑판처럼 사각형으로 잘 나뉘어져 곳곳에 각종 어구들이 흩어져 있고, 어부들의 손길을 기다리는 고깃배 몇 척이 바다에서 훌쩍 뛰어올라 젖어버린 아랫도리를 송두리째 엿보이고 있다.

이제는 삶이 용솟음치는 치열한 현장으로서의 너른 광장을 이루고 있다. 거대한 크레인으로 어구(漁具)를 들어 올리는 모습이 얼마나 역동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지 바라보기만 해도 저절로 활력이 넘쳐흐른다.
너른 광장을 지나 해안으로 이르다가 오색으로 피어있는 코스모스 꽃밭을 만난다. 바닷바람이라도 불어대는지 하늘거리듯 누비고 있는 발걸음이 살아있다. 중년의 여인 몇몇이 카메라 앞에서 포즈를 취하면서 연신 입가에 미소를 가득 머금는다.
그 모습이 엿보이고 있는 듯 가리고 있는 듯 포구의 잔잔한 파도처럼 출렁인다. 가슴으로 파고드는 바람결은 싸늘한 가을이면서도 맑고 밝은 햇살의 한 가닥을 품어 옮겨준다. 포구의 가을바람이 한결 부드러워진다.
광장의 끝에 이르자 바다다. 손에 잡힐 듯 가까이에 머물고 있는 고깃배들은 서로가 서로의 어깨를 기댄 채 한 폭의 동양화를 그려놓는다. 작은 파도에 작은 몸을 흔들면서도 먼 바다를 향수처럼 그리고 있는지 큰 몸짓으로 외해(外海)로 빠지는 포구의 입구를 향하여 크게 흔들기도 한다. 유화(油畵) 한 점이 물결 위에서 꼿꼿이 출렁이다가 먼 바다로 나아가면서 보이는 뒷모습을 되살려놓는다.

문득 출렁이는 고깃배 사이로 드리워진 채 햇살을 모으고 있는 낚싯대 한 대가 보인다. 바다에 반쯤 가라앉힌 낚싯대의 주인은 없다. 한 마리의 고기를 낚기 위해서 낚싯줄을 던져놓고서도 찌만 보일 뿐 미동조차 내려놓은 듯하다. 낚싯대의 주인은 어디로 간 것일까, 고요한 평화가 가득하다. 아니 평화의 고요함이 가득하다. 그래서인지 무엇인가를 기다리게 한다.
천천히 포구를 빠져나가는 방파제 끝으로 등대 둘이 서로 마주 보고 서 있다. 정 깊은 눈길로 먼 바다로부터 밀려오는 물결을 맞아들이고 있다. 포구의 안온(安穩)과 휴식과 더불어 간간히 밀려오는 이웃의 웃음소리와 갈매기의 끼룩거리는 소리가 만찬을 준비하려는 듯 바쁜 아낙의 손길처럼 따뜻하게 들려온다.

아, 이 아름다운 포구의 정경(情景)이야말로 세상의 모든 그리움이란 그리움을 모조리 끌어 안겨주는 듯 삶의 향기를 북돋워주면서 가슴 설레게 한다. 마량 포구의 푸른 물결은 끝없는 이랑을 만들어대고, 힘찬 바다 물이랑은 하늘 높이에서 푸르름을 끌어내려 한 몸을 이루더니 마침내 갈매기의 흰 날개 빛으로 바다와 하늘 사이를 활기차게 한다. 수평선을 향하여 마냥 미끄러지듯 포구를 빠져나가는 어선 몇 척이 기운차게 달려 나간다.
그러나 평화와 안온이 가득한 이곳 마량포구에는 고려 말부터 대적(大敵)들이 자주 침입하였던 곳으로 알려져 있다. 조선 세종 때에는 병선(兵船)이 자주 정박하였던 곳이라고 전한다. 그 옛날 지형이 ‘마른 말 같다’고 하여 ‘마량(馬梁)’이라고 불렀다고는 하지만 말의 모습은 간 곳조차 보이지 않고 서해화력중부발전소가 세워지면서 위협적으로 솟아오른 굴뚝만이 너른 바다를 노여움으로 출렁거리게 하고 있다.

등대로 향하는 방파제로 향한다. 방파제 벽으로는 벽화(壁畫)가 그려져 있다. 성경전래 200주년을 맞아 2016년 9월에 그려진 <마량진 한국 최초 성경전래 고증벽화>이다. 그렇다. 이 포구는 우리나라 최초로 성경책이 전해진 곳으로 유명하다.
마량도 앞바다로 1816년 9월 5일, 영국 함선 알세스트호(함장 머레이 맥스웰)과 리라호(함장 바실 홀)가 영국의 해상교역로 확보를 위해 중국 연안과 우리나라 서해안을 탐사하던 중 이곳 마량진 갈곶에 정박하게 된다. 그리고 마량첨사 조대복과 비인현감 이승열에게 3권의 책을 선물로 주었으니, 그 중 한 권이 킹 제임스 판 성경책이다.
선뜻 방파제에 올라 바다로 이어진 방파제 끝을 향한다. 천천히 걸어가는 발걸음임에도 가볍기 이를 데 없다. 지금 걸어가는 끝에는 아침과 저녁을 열고 닫는 저 푸른 하늘의 눈부심과 바다의 출렁임이 함께 하는 곳이다.

이 세상의 만물이 태어나기라도 하는 듯이 아침을 맞은 가슴 그대로 깊이 잠들어버리는 저녁으로 하루의 휴식을 맞이하다 보면 이곳에서는 분명한 종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리라. 그래서 더욱 빛나는 마량포구가 된다. ‘해뜨고(Sunrise), 해지는(Sunset)’ 한 곳에서 하루의 시각을 만나는 이곳은 놀랍고도 신비롭기만 하다.
이성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을 만큼 신기하고 묘한 곳이어서 더 이상 무어라 더할 수 없다. 문득 미국의 시인 W. 휘트먼(Walt Whitman. 1819~ 1892)의 시 한 구절이 떠올린다.
오! 선장/나의 선장이여!/ 우리의 무시무시한 항해는 끝이 났고/배는 모든 고통을 이겼고, 우리가 구하던 상금을 얻었고/항구는 가깝고, 나는 종소리를 듣소/사람들은 모두 환호성을 지르고 있고 ― W. 휘트먼(Walt Whitman. 1819~ 1892)의 <오 선장! 나의 선장이여!> 중에서
방파제 끝으로부터 몸을 떼어내면서 마량포구마을을 바라본다. 마을을 옹위하고 있는 산등성이 너머로 보이는 한국중부발전 서천화력발전소의 굴뚝이 온 마을을 순식간에 집어삼킬 듯 사뭇 위협적이다.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한다. 가슴이 조금씩 옥조여온다.
그러나 먼발치로 <한국최초 성경전래지 기념관>이 마치 기도처럼 눈부신 햇살을 휘감으며 경전의 한 구절 한 구절을 조근조근 끊임없이 들려준다, 그곳 그 빛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긴다.

미량포구에서
구재기
어떠한 모양새나
이름으로도 불릴 수 없고,
만질 수도 떨쳐버릴 수도 없는
그 무엇이든 헛됨 없이
빛 한 줄기 찾아 살아가야 한다면
평생 먹고 살기 위해
기도하듯 하는 일처럼
소금에 절여진 생선과도 같이
바람을 거슬리지 못한 채
굳어있는 몸 너끈히 이겨내야 한다면
아침의 해돋이로 하늘을 열고
저녁의 해넘이로 바다를 재우는
이곳으로, 발걸음을 가벼이 하라
갈맷빛 바다 가득 향기를 모아
앙가슴 사이로 출렁이게 하는 이 포구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감출 수 없는, 몸과 말과 뜻으로
그럴싸한 알맹이 하나 없이
어찌 이곳에서 함부로
한숨을 외쳐 부를 수 있겠는가
언제나 고요하고 평안한
너른 바다, 끊임없는 물결처럼
사랑과 평화, 그리고 휴식이 넘쳐나듯
하늘과 바다가 나긋나긋 허락해놓은
이곳에는 만날 팽팽한 힘이 넘쳐나 있다
*만날[萬-] : 어떤 경우든 한결같이